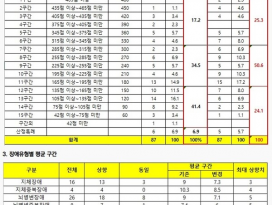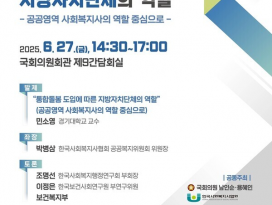자유롭게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더욱 더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동료지원(Peer Support)이다. 동료지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또 다른 장애인을 지지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은 미국에서 비롯된 시민권 운동의 전통에 뿌리를 둔 정치적 동료지원 개념을 충실히 계승해 왔다. 이는 장애인 내부의 불평등 구조를 해체하고 권한 부여(empowerment)를 통해 억압과 배제의 역사에 도전하려는 시도였다.
그 과정에서 ‘동료’란 곧 장애 정체성을 공유한 정치적 주체를 의미했다. 따라서 동료지원은 단순한 정서적 지지가 아닌 정치적 동력과 자기결정권, 권리의식 고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논리적 표현력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설득,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리더십과 친화력이 그 필수 조건으로 간주됐다.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한 많은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이 기준을 중심으로 동료가 되었고,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동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모든 장애인이 이런 ‘동료’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가?”
최근 들어 뇌성마비,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는 기존의 동료지원 개념이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기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 말보다는 감정이나 행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에게 있어 ‘정치적 리더십’이나 ‘논리적 설득력’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러나 이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존엄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료지원의 개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동료지원 개념은, 장애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적 동료’에서, 상호의존(Interdependence)과 사람중심실천(Person-Centered Practice)에 기반한 ‘생활 속의 동료’로의 전환이다.
여기서 동료란 더 이상 ‘장애 정체성을 공유하고 표현력이 뛰어난 정치적 주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는 친구, 가족, 이웃,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존재들 역시 동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개념의 수정이 아니다. 자립생활센터가 앞으로 생존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화다. 이를 위해 센터는 장애 유형이나 표현력, 정치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의 ‘지원 서클(support circle)’을 조직해야 한다.
이 서클은 기존의 활동가뿐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인들까지 포함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관계 맺기 프로그램이 함께 구성돼야 한다.
이러한 확장된 동료지원은, 지금까지 동료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수많은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로 세우는 길이다. 자기표현이 어렵고 조직적 활동이나 정치적 대응이 힘든 이들도 삶의 방식과 속도에 맞게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자립생활센터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조 조정이나 양적 팽창이 아닌 동료지원의 본질적 재정 의와 확장,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는 ‘누가 동료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그 답을 통해 새로운 자립생활운동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다.
*이 글은 한국자립생활연구소 안형진 박사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no.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
| 공지 |  | 관리자 | 2433 | 2023년 2월 22일 |